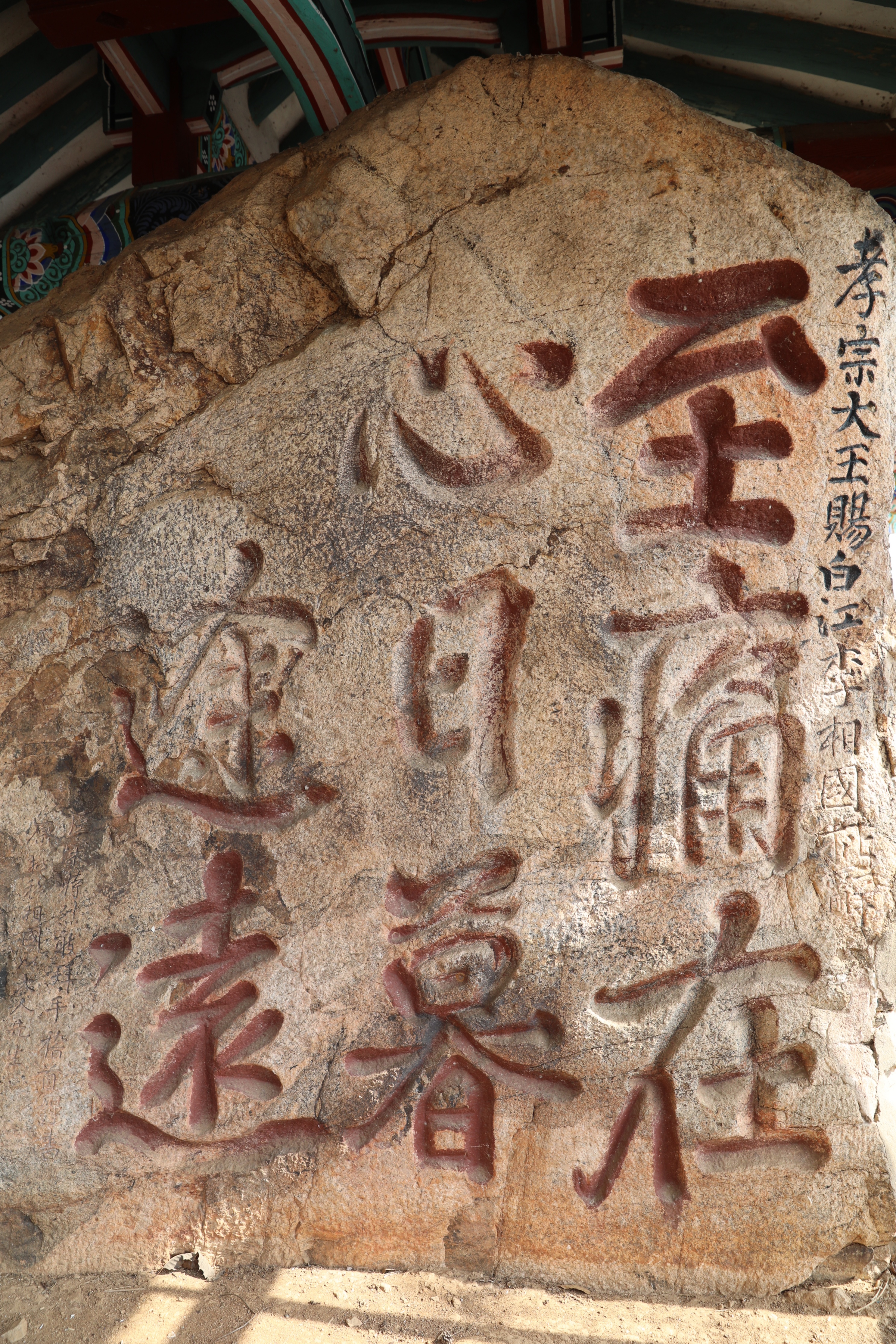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6호 _ 부여동헌 (扶餘東軒) 수 량 : 3동지정일 : 1982.08.03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5 (관북리) 조선시대 부여현의 관아 건물로 동헌·객사·내동헌 등이 남아있다. 동헌은 당시 부여현의 공사를 처리하던 곳으로, 고종 6년(1869)에 지었고 1985년에 크게 수리하였다.동헌은 앞면 5칸·옆면 2칸의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화려한 팔작지붕집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도 하는 공포를 짜지 않은 민도리집으로, 앞면 5칸·옆면 2칸의 규모이다. 왼쪽 3칸은 대청으로 판벽을 치고 문을 달았으며, 오른쪽 2칸은 온돌방을 들이고 앞쪽에 툇마루를 놓았다. ‘초연당(超然堂)’이라는 현판이 결려 있으며 ‘제민헌’이라고도 한다.동헌과 같은 ..